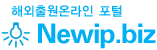작업자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관성센서시스템 개발

회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최적화된 운영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검사원들은 에러에 노출된 수동 조립 방식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공정 시간을 조사했다. 새롭게 개발된 시스템은 자동으로 시간을 기록하고 회사를 위해 비용을 절감한다.
취급용 공구, 조립, 삽입, 결합 그리고 볼트 부품, 페인팅 부품, 작용 장치 등 수많은 작업 공정은 반드시 제품이 포장되고 이송되기 이전에 진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개별적인 작업공정을 위해 노동자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가? 수동 조립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산업계의 제작회사들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노동자의 작업 상황을 연속적으로 분석하고 최적화해야 한다.
그들은 개별적인 작업 공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작업 시간을 기록해야 한다. 이것을 통하여, 그들은 시간을 허비하고 제작 프로세스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취급 거리와 비실용적으로 위치한 부품, 과다하게 자주 이루어지는 도구의 변화나 불규칙하고 불필요한 이동 등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 모든 개별적인 움직임은 보통 노동자에 의해 수동으로 움직이는 디지털 시계 보드나 누군가에 의한 스톱워치에 의해 시간이 측정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법은 진실로 명확한 것은 아니다. 그 자료는 오류로 가득 차 있고 모두를 결부시키기에는 불합리하다. 그 시간 측정상황에서는, 노동자의 스트레스 요소가 매우 높고 일상적인 속도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회사를 위해, 이러한 작업은 스탭 조직으로부터의 작업이 필요하며 이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더욱 정밀하고 자동화되며 비용효율적인 솔루션이 매우 필요하다. 독일 마그데부르크의 엔지니어링 회사인 DR. GRUENDLER사와의 계약을 통해, 프라운호퍼 연구소 공장 운영 및 자동화분야 IFF(Fraunhofer Institute for Factory Operation and Automation IFF) 연구진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했다.
소매에 통합된 3개의 성냥갑 크기의 센서는, 손과 팔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예를 들어 손의 뻗음, 쥠, 세팅 업 과정, 결합, 검사 또는 놓는 것과 같은 개별적인 움직임의 처음과 끝을 측정한다. 상호연결된 센서 모듈은 상하부 팔과 손에 있다. 노동자들은 단순히 두 개의 소매를 착용하기만 하면 된다. 이 시스템은 두 번째 피부처럼 숨어 있는 상태로써 편안하며 착용자들을 괴롭히지 않는다.
“현재 사용 중인 스톱워치 방식은 상황에 따라 5명을 동시에 시간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검사자에게 허용한다. 우리의 솔루션은 추가적인 작업이 없이 몇 군데의 작업현장에서도 시간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이 가진 높은 정확성과 명확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프라운호퍼 연구소 IFF의 연구 매니저인 Martin Woitag씨는 말했다. Woitag씨와 그의 연구팀은 그들의 솔루션에 관성 센서를 사용하였다.
그것들은 X, Y, Z 축으로 팔과 손의 각속도와 가속도를 측정한다. GPS와 같은 다른 동작 추적시스템과는 달리, 관성 측정시스템은 다른 인프라시설이 없이도 작동된다. 관성 센서는 독립적으로 공간에 있는 물체의 위치를 검지한다. “게다가, 우리가 개발한 솔루션은 복잡한 캘리브레이션이 불필요하다. 조립 현장에서 한 번에 직접 측정 지점을 지정하는 툴만이 필요한 전부이다.”라고 Woitag씨는 말했다.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이 시스템을 완성한다. 이 소프트웨어는 센서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동작 시이퀀스를 계산하고 재구축한다. 이 소프트웨어는 프로세스를 동작 세그먼트로 분할하고 관련 시간을 확인해 준다.
현재, 소매는 물류 산업과 제조산업에서 작업현장에서 앉아서 조립 작업을 시행하는 데 이용이 가능하다. 다음 단계에서, 독일 마그데부르크의 연구진들은 작업자가 서 있거나 움직이면서 조립 작업을 시행하는 것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추가로, 그들은 이 센서를 특정한 자세를 검지하는 데 사용하여 작업현장의 인체공학적 상황을 분석할 계획이다.
출처: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본출처: physorg.com